Focus on technical transmission during 1960s~1980s, production technology change, and demand formation
Najeon(螺鈿) is a wooden lacquer-ware decoration technique to process shell to make Jagye, then make pattern with Jagye, and decorate the lacquered side(漆面). Time scope of research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focusing on 1960s~1980s, which is considered as most activated period in transmission of Korea Najeonchilgi and technical transition, also, 1910s, when major craftsmen of that period were born and trained. Najeonchilgi was settled down as the ordinary furniture, on the other hand, each period has specific demand, i.e. Najeon articles and furniture targeting Japanese during 1910s~1940s, Najeonchilgi decorative digar box or baton, sold to U.S. Army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since 1945, and Jagyejang which spread to the lower· middle class from 1970s to 1980s in domestic. Along with change in demand class to lower· middle class during 1970s~80s, the shape and use also have changed. This way, under the huge frame of social change, demand on Najeonchilgi was formed, due to this, technique changed, also, technicians adopted or developed the technique proper for it.
1. 연구배경
1.1 연구 배경
나전(螺鈿)은 조개껍질을 가공하여 자개를 만들고 자개로 무늬를 만들어 칠면(漆面)에 장식하는 칠기 장식 기법이다.1 나전칠기는 공예기술 중에서도 기술전이가 어렵고, 생태적, 미적으로 타 분야에 비해 희소성이 있는 기술로,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극명한 변화를 거쳐 온 분야이다. 이 연구는 나전칠기의 사회적 확산을 생산-유통-소비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해, 그로 인해 형성된 문화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나전공예의 형성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2 되었으나, 광범위한 주제로 현재 그 범위를 좁히고 연구의 초점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 와 있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한국 나전칠기의 전수 및 기술 변이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여겨지는 1960~1980년대에 초점을 두는 것과 함께, 당대 주요 활동가들의 출생 및 교육이 이루어진 1910년도를 기점으로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1910-1980년대 사이 발행된 신문3, 잡지4 , 전시5등을 대상으로 나전칠기 관련 인물, 정책, 활동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모아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였고, 기술 전수, 생산기술 변화, 수요 형성의 세 가지 맥락을 도출하였다. 본 초고에서는 세 가지 맥락에 대해 각각 분석된 현황을 정리하는 형식으로 서술하고, 소결을 달아 마무리하고자 한다. 실제 위의 세 가지 맥락은 1910-1980이라는 시대 안에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각계로 갈라낼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연구가 지향하는 가치와 쓸모가 달라진다.
향후 연구에 있어 이 세 가지 맥락의 주요 쟁점을 밝히는 질문 단계를 거쳐 하나의 핵심 주제를 도출하고, 심층 연구6를 이어갈 예정이다.
2. 기술의 전수
2.1. 연구 내용
나전칠기 기술의 전수는 학교교육이 아닌 이른바 도제식(徒弟式) 전승체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가설을 전제로, 기술 전수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문헌에서 언급7된 나전칠기 관련 인물들을 추출해, 인물 간 전수 관계, 교육기관 수료 내용을 파악했고, 활동 궤적 확인을 통해 연결고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10년대 전승규, 김진갑 이라는 인물을 시작으로 두 갈래로 대별되는 나전칠기의 계보가 형성되었으며, 두 인물 및 전수자들의 활동 궤적 또한 구별되는 경향을 보였다.
일제강점기인 1910년~1945년 사이 전승규 및 김진갑8을 비롯한 전수자들은 대체로 조선총독부의 나전칠기 관련 제작기관인 중앙시험소, 한성미술품제작소9를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조선미술전람회10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45년 이후 각 전수자들의 궤적 분리가 나타나는데 특히 김진갑의 전수자들은 주로 정부에서 운영했던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이하: 국전)11 에 작품을 출품하거나, 한국공예시범소12 및 한국디자인포장센터13에 관계하며 기관에서 추진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및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상품개발’ 관련 정부 정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진갑이 설립한 ‘신성공예사’를 중심으로 나전칠기 기술의 전수와 정책 참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된 활동을 벌인 백태원, 한도룡 등은 1960년대 이후 국내 미술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며, 활동을 이어갔다.
이와 달리 전승규의 전수자들은 지방에서 활동을 이어갔는데, 태천의 군립칠공예소, 통영에 설치된 경남나전칠기강습소와 원주의 칠공예주식회사 등 주로 재료 산지를 중심으로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보이며, 일부 전수자들이 국전이나 정부 올림픽기념품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등 행적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전승규의 전수자 중 김봉룡, 김성수, 송주안, 송방웅, 심부길, 심종언, 이형만, 김옥석, 양옥도 등은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14로 등록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수자들을 길러내고 있다.
한편 1960년대부터 시작된 노동청(現 고용노동부) 주체의 기능경기대회15에 참여했던 ‘나전 칠기공’들은 계보 안의 연결고리와 단절된 인물들로 구성되어있으며, 당시 공업생산기술 향상을 위한 기능공으로 양성되었다가 현재는 직종이 폐지되어 관련 인물들 또한 종적을 감추었다.(※ 전수계보 연표 참고)
2.2. 소결
각각의 전수 계보는 조사된 것 이외의 광범위한 영역으로 퍼져 나가 현재로 이어지는 반면 완전히 단절된 흐름 또한 드러난다. 전수자들의 세세한 궤적 속 드러난 사실을 살펴보면 사회 속에서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활동을 벌이는 한편, 스승으로부터 이어지는 계보를 강조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드러내기도 한다.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영역을 구축하지만, 종국에는 기술 전수의 흐름이 단절되기도 한다. 향후 연구에 있어 상기의 흐름들이 갖는 성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각 전수자들의 작품에 나타난 변화 양상(나전칠기 문양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술이 온전히 전수되었는지, 혹은 변화되었다면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현재 나전칠기 공예의 형성 요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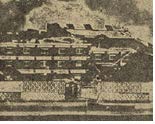
3. 생산기술의 변화
3.1. 내용
나전칠기 생산기술의 현황 파악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문헌조사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조사된 시대별 생산조직의 형태와 관련 이미지를 통해 그 변화를 추측해 보고자 한다. 이미지를 통해 드러난 대표적인 생산조직의 형태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1938년도 경성지역에서 운영된 경성
나전칠기 제조소‘(그림1)16 로 소규모의 가내수공업 형태이다. 두 번째는 1933년 일본인들이 운영했던 ‘통영칠기제작소(그림2)’17 로 분업화가 이루어진 공장 체제 초기 단계로 보인다. 동일한 시기의 ‘태천군립칠공예소’18 ,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19등에서도 분업화된 조직운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형태는 광복 이후 북성공예사20의 목공부(그릇제작), 라전부(자개), 칠부(칠)의 삼부로 운영되는 모습에서도 발견된다. 마지막으로 1950년대 설립된 ‘파고다가구공예점(그림3)’21은 사내에 공예미술연구실을 두어 패의 도안과 제품 디자인 개선을 연구하였으며, 제품 종합 검사부를 두어 각 공정마다 검사원이 나가 중간검사, 포장검사 등 최종 검사에 이르는 조직적인 품질관리를 하는 등 제조 전 과정을 완전 분업화한 공장 체제를 갖추었다.
한편 1940년대 김진갑이 설립한 ‘신성공예사’는 독특한 형태를 보이는데, 도안실, 칠부, 목공부로 나뉘는 분업화된 구조는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와 유사하나, 주로 견본을 제작하고, 대량생산 하청을 주는 구조22는 오늘날의 디자인 회사와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
3.2. 소결
과거의 간단한 도구와 손으로만 제작되었던 것에서 점차 공장 체제를 갖추며 분업화, 기계의 사용, 대량생산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단순한 기술 변화뿐만 아니라 나전칠기 기술이 갖는 정체성 또한 바꿨을 것으로 보인다.
나전칠기의 전통적인 제작 방법은 목부(백골)에 베(포)를 밀착시키고 그 위에 순옻칠과 자개를 박는 것23으로 제작기간 또한 큰 장의 경우 백골 제작, 패각 절단·부착, 생칠·도부·건조·연마 반복 등 6개월의 시일이 걸리는데, 대량생산은 재료 변경(순옻칠을 캐슈 칠로, 베접착 제외), 제작 단계 생략 (칠, 도장, 건조 등) 등 전 과정의 단축과 함께 기계화된 제작방법이 적극 도입된다. 이러한 큰 흐름 아래 중·소규모의 제작소들은 생산속도를 따르지 못하거나, 새로운 기계에 변화된 나전칠기의 모습에 뒤처져 자취를 감추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극적으로 확산되었던 공장 체제 또한 수요의 감소로 생산이 중단되기에 이른다.
향후 연구에 있어 각 생산조직의 생산품의 조사를 통해 나전칠기의 변화 모습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앞의 조직 형태에서 언급된 1930년대 제작소류, 1970년대 활성화되었던 ‘파고다가구공예점’, 그리고 시기적, 형태적으로 그 중간단계인 1950년대 ‘신성공예사’의 생산품을 주요하게 살핀다. 이를
통해 나전칠기의 확산과 쇠퇴 현장을 포착하여 현재 기술 단절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4. 수요 형성
4.1. 내용
나전칠기는 일상 가구로 자리하는 한편, 시대마다 특정한 수요가 존재했는데, 1910~1940년대 사이 일본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나전 기물 및 가구, 1945년 이후 미 군정 당시 미군들에게 판매되었던 나전칠기 장식 담뱃갑이나 지휘봉,241970년에서 1980년대 국내 중·하류층으로 확산되었던
자개장이다. 본고에서는 자개장에 초점을 맞추어 일상 가구의 수요 형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1950년대 이후 출간된 여성 잡지에 노출된 자개장의 모습과 신문 기사를 통해 발표 된 판매가격(물가비교) 조사를 통해 시대별 수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60년대 가정집에 놓였던 자개장은 유물(그림4)의 형태를 갖는 3층 장류(그림5)와 대형 장롱의 형태(그림6, 7) 등이 나타났다. 1966년 자개농의 가격은 270,000원25으로, 당시 쌀 한가마의 가격인 3,350원26과 비교하면 무려 80배의 가격차이가 나는 매우 고가의 가구로, 수요자는 상류층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에는 자개장이 80만 원27 쌀 한가마 21,000원28으로 그 가격차이의 폭이 다소 좁아진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에는 큰 폭으로 가격이 내리는데, 1979년 자개 애기장(그림8)이 11만 원인 것을 비롯해 화장대 29,000원, 사방탁자 24,000원29등 전반적인 나전가구의 가격이 당시 쌀 한가마니 41,000원30과 비등하며, 나전가구의 사용이 중·하류층까지 확산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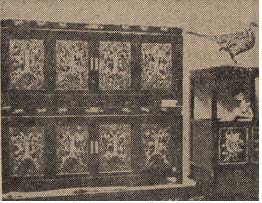
4.2. 소결
1960년대 상류층의 일상가구로 자리를 잡았던 자개장은 1970~80년대를 기점으로 중·하류층으로 수요계층의 변화와 함께 그 형태와 쓰임 또한 변한다. 특히 1970년대부터 시작된 아파트 건설 붐과 함께 그 안의 서구화된 가구들과 자리를 잡으며 60년대와는 또 다른 실내 풍경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그림9). 하지만 80년대 이후 서구식 장롱(원목 가구 계열)에 자리를 내주며 급속히 사라진다.
또한 위와 같은 자개장의 수요 변화에 따라 생산기술의 변화도 궤를 같이 하는데, 특히 1930년대 이후 소규모 제작소의 수공업 생산방식의 자개장이 1960년대의 일상의 가구로 자리를 잡았고, 1960년대 이후 서서히 시작된 급속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장 체제로 돌입, 이후 생산 된 저가의
자개장들이 1970~80년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사회의 변화라는 거대한 틀 아래 나전칠기의 수요가 형성되고, 그로인해 기술이 변화했으며, 기술자들은 그에 부합하는 기술을 도입하거 발전시켜나갔다. 향후 연구에 있어 나전칠기 수요자들에게 영양을 준 사회 요인에 초점을 두어 그 변화를 밝히고자 한다. 본 맥락의 연구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나전칠기 전반의 확산과 쇠퇴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국립문화재연구소, 『우리나라 전통 무늬 나전화각』,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
- 서수연, 「나전 칠기의 사회적 확산 -1873년~2000년대 사이 생산-유통-소비 변화를 중심으로」,한국 디자인학회 2014 봄 학술발표대회, 2014.05.24 ↩︎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겨레) ‘나전’을 키워드로 출력된 기사 2,305건 ↩︎
- 여원(1955.10~1970.4, 월간, 총175권), 여성중앙(1970.1~1995.3, 월간, 총 303권), 여성동아(1967.11~2015.6, 월간, 총 572권) ↩︎
- 조선미술전람회(1932~1944), 대한민국미술전람회(1949-1981) ↩︎
- 핵심 주제에 대한 주요인물 인터뷰, 현장답사, 관련기관/단체 정보요청 등 조사기법 확대를 통해 연구의 깊이를 더해갈 예정이다. ↩︎
- 나전’을 키워드로 출력된 기사 2,305건 중 인명추출 한 후 관련 활동 5회 이상 참여한 자를 중심으로 하며, 그 외 국가인증(중요무형문화재제도) ↩︎
- 이외에도 엄항주 및 박정수 등 동시기의 인물들이 발견되었고, 몇몇 전수자들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후 활동 기록이 드러나지 않아, 현재 조사는 잠정적으로 보류한 상태다. 이후 결정되는 연구주제에 따라 필요하다면 추가 진행하고자 한다. ↩︎
- 1930년 설립, 이후 이왕직미술품제작소 1911년, 조선미술품제작소 1921년 변경 ↩︎
- 일제 강점기부터 조선총독부가 주관하여 1922~1944년 총 23회에 걸쳐 개최한 종합 미술전람회…1932년 제도 개편에 따라 조선의 향토미술을 장려한다는 취지아래 공예부가 신설. 월간미술, 조선미술전람회, http://monthlyart.com, 2015 ↩︎
- 1949년부터 1981년까지 총 30회 동안 이어온 한국의 관전…문교부 고시 제1호에 의해 조선총독부가 주관했던 <조선미술전람회>의 규약을 모태로 국전제도 규정. 초기 운영을 문교부에서 주관, 그 뒤 주관부처가 문화공보부 옮겨져 운영. 월간미술, 대한민국미술전람회, http://monthlyart.com, 2015 ↩︎
- 1949년부터 1981년까지 총 30회 동안 이어온 한국의 관전…문교부 고시 제1호에 의해 조선총독부가 주관했던 <조선미술전람회>의 규약을 모태로 국전제도 규정. 초기 운영을 문교부에서 주관, 그 뒤 주관부처가 문화공보부 옮겨져 운영. 월간미술, 대한민국미술전람회, http://monthlyart.com, 2015 ↩︎
- 1970년 설립, 2001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출범. 한국디자인진흥원, 연혁, http://www.kidp.or.kr, 2015 ↩︎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큰 것을 의미하며, 1967년 김봉룡이 최초 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 기능보유자 지정. 문화재청, 문화재검색, http://www.cha.go.kr, 2015 ↩︎
- 기능경기대회는 기능자들이 기능을 상호경쟁함으로써 산업근대화의 바탕이 되는 기능을 향상, 발전시키는 계기를 이룩할것으로 목적으로 함.「技能競技大會(기능경기대회)개막」,『매일경제』, 1966.9.10, 2면 ↩︎
- 「工場巡礼(공장순례) (5) 螺鈿工業(나전공업)」,『동아일보』, 1938.8.14, 6면 ↩︎
- 「統營螺鈿漆器(통영나전칠기) 年產二萬圓(연산이만원)」,『동아일보』, 1933.12.22, 4면 ↩︎
- 백골, 옻칠, 나전의 세과로 운영. 최공호, 「2005년도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시리즈백태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5, p.25. ↩︎
- 목공부, 도안부, 칠부(도장부)로 구성. 최공호, 위의 책, p.2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5, p.25. ↩︎
- 「紙上見學(지상견학) (2) 찬란한 공예품 자개그릇만들기」,『경향신문』, 1947.3.2, 1면 ↩︎
- 「鳳凰賞(봉황상)을 탄 이商品(상품)의 특징은! (41) 파고다家具(가구)의 나전칠기」,『매일경제』, 1967.7.10, 2면 ↩︎
- 최공호, 앞의 책, p.100. ↩︎
- 「民藝(민예)의 마을 (3) 統營(통영)의 螺鈿漆器 (나전칠기)」,『경향신문』, 1966.7.4, 5면 ↩︎
- 최공호, 앞의 책, pp.89~110. ↩︎
- 시중에 팔고 있는 자개농(나전칠기) 규격이 197×91내지 121짜리가 27만원, 212×258내지 268짜리가 35만원. 「자개籠(농)」,『매일경제』, 1966.7.9, 4면 ↩︎
- 「市况(시황) 쌀값계속오르고」,『매일경제』, 1966.04.14, 3면 ↩︎
- 티크장이 16만원~28만원, 자개장은 80만~1백50만원 정도.「家具(가구)구입 要領(요령)과 가격」,『매일경제, 1976.8.21, 8면 ↩︎
- 「週間市况(주간시황)」,『매일경제』, 1976.02.16, 5면况(주간시황)」,『매일경제』, ↩︎
- 자자개밥상 2만2천원, 사방탁자 2만 4천원, 애기장 11만원, 자개화병 대 2만2천원, 자개화병 중 9천5백원, 고가구모조품 6만원, 자개화장대 2만9천원, 보석함 4천 5백원.「찬바람이는 家具(가구)업계-값 크게내려」,『경향신문』, 1979.08.10, 4면 ↩︎
- 「一般米(일반미)한가마 41,000원」, 『동아일보』, 1979.01.09, 2면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