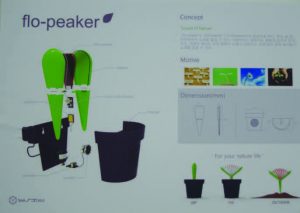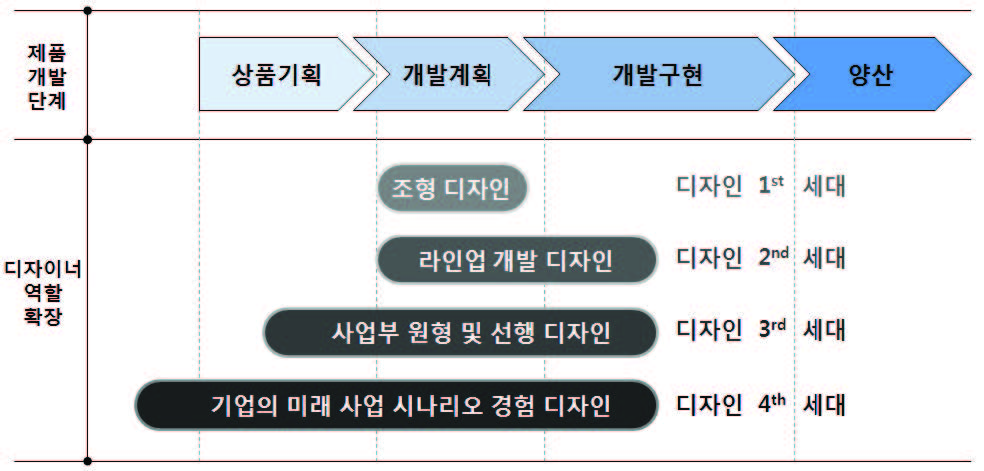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9년 기대수명이 80세를 넘을 정도로 장수 사회에 접어들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노인인구 비중이 7%를 웃돌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14.3%)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115년 미국은 73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18년 만에 고령사회로 옮겨가고 있는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에서 100년 넘는 기간을 통해 진행되어온 고령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짧은 기간에 진행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응 할 수 있는 복지나 사회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올해 6월 23일자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5000만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20-50’(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명) 클럽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이자 인구 측면에서도 강국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리보다 먼저 20-50 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일본(1987), 미국(1988), 프랑스·이탈리아(1990), 독일(1991), 영국(1996) 등 주요 6개 선진국뿐이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적 구매력 평가 기준 국민소득에서도 우리나라는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이런 좋은 소식은 향후 30년간 생산 가능인구가 일본, 독일, 한국 순으로 가장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좋지 않은 전망과 함께 전해졌다. 특히, 2045년부터는 인구가 5000만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고령화 시대의 대비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65세이상에 대한 부양 비율은 2010년 15.2명에서 2030년에 38.6명에서 2060년에는 80.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층이 38.2%나 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평균 수명이 늘었다는 것은 단순히 고령화된 상태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인생주기의 진행 자체가 더 긴 시간 축에서 진행되어 노화 역시 늦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의학적으로 과거 고령자로 분류되던 65세 이상 연령 인구에서 이제는 노화 징후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들은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고령화 인구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계층을 잠재적 생산 활동 인구로 볼 수 있다면 고령화사회에서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는데 큰 기여가 될 것이다. 다만, 이들이 사회 생활과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환경이 갖춰 질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이 잘 갖춰진 여건이 필요하다. 씨티그룹은 2050년 우리나라 구매력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107,000 달러로 세계 4위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고, 골드만삭스는 2050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9만 달러로 세계 2위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고령화 시대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령 인구의 생산 활동 참여 및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않고 스스로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현재처럼 고령자가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지원을 받는 사회구조가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될 것이다. 한편,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뿐 아니라 이들을 돌봐야 할 사람도 함께 늙어가게 된다. 일본에서는 이런 현상을 노인이 노인을 보살핀다고 해서 ‘노노부양’이라 부른다. 보살핌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살피는 사람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도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다.
유니버설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은 세가지의 측면에서 그 대상 범위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장애이다. 즉, 일반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나이의 축이다. 어린이에서부터 시작하여 성인을 지나 고령자까지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는 상황의 축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부터 특별한 상황 (어둡거나, 시끄럽거나, 위급하거나, 춥거나 등등)에서도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없는 성인일지라도 장애적 상황에 접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촉감에 의존해 라디오를 조작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때 사용자는 시각 장애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고령화는 장애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고령자를 위한 디자인을 살펴보는 것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접근에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고령자는 시,청각 등 감각측면, 기억, 판단 등 인지적인 측면 및 힘, 정밀성 등 신체적인 측면에서 점진적인 장애 요소를 갖고 있으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 청각, 인지장애 등 복합장애를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유니버설디자인은 좋은 디자인의 요소를 모두 갖춰야 한다. 론 메이스가 제창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7대 원칙은 좋은 디자인이 갖는 어떤 요소도 깎아 내리지 않고 다만 더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7가지 원칙은 1. 공평한 사용성: 어느 그룹의 사용자에게도 유용하고 판매할 만한 디자인 2. 사용의 유연함: 넓은 범주의 개인적 선호도 및 능력을 충족시키는 디자인. 3. 간단하고 직감적인 사용성: 사용자의 경험, 지식, 언어능력, 집중력 등에 제한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4. 감각정보 이용의 용이성: 환경의 열악함이나 사용자의 감각능력에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와 교환할 수 있는 디자인 5. 에러에 대한 관용: 실수나 의도하지 않은 조작에 대하여 위험을 최소화 하는 디자인 6. 신체적 수고를 줄임:효과적이고 안락하며 최소의 피로를 요구하도록 하는 디자인 7. 크기와 공간의 적정성: 사용자의 신체 크기, 자세, 움직임을 고려해 적정한 크기와 공간을 제공하는 디자인이다. 일본에서 제안된 유니버설디자인의 평가기준 PPP (Product Performance Program)는 위에 언급한 7가지 요소 외에도 내구성과 경제성의 배려, 품질과 심미성의 배려, 보건과 환경의 배려라는 3가지 측면을 더하여, 좋은 디자인이 가지는 고려 요소들을 갖추어야 좋은 유니버설디자인임을 말해주고 있다.
산업 영역으로서의 유니버설디자인
전술한 바와 같이 유니버설디자인은 좋은 디자인에 덧붙여 장애, 나이, 상황을 고려한 더욱 범용성있는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좋은 디자인보다 더 구현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때문에 유니버설디자인은 좋은 것을 해야한다하는 류의 선언적인 측면이 강하고 산업영역에서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공공의 영역에서는 비용에 대한 제약이 적으므로 정부 주도의 공공 시설물이나 건축물과 관련한 법률의 제정 등이 선행되고 있지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려면 이 영역이 상업적인 산업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일상 생활 속의 제품, 서비스, 환경이 유니버설디자인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이 그 이전에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한 개념이었던 Barier free Design, Adaptive Design, Lifespan Design 등 보다 더 발전된 개념으로 정립될 수 있는 것은 그 것의 범용성에 있다. 범용성이 있다는 것은 장애인이나 고령자등 소외된 계층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서 산업적인 영역에서도 스스로 독립적인 시장을 만들 수 있고, 궁극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제공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물의 장애인용 언덕길은 휠체어를 위해 고안되었지만 휠체어 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바퀴가 달린 트렁크 등 어린이나 일반인의 사용빈도가 100배 이상 된다는 점에서 범용성(universality)이 높게 이용되고 있다.
유럽 전기통신 표준협회의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ETSI EG 202 116 Human Factors (HF); Guidelines for ICT products and services; ‘Design for All’) 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산업영역에서의 범용성을 고려하여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 이를 소개하면,
1. 시장의 확대 : 고령자 층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은 구매력이 높은 계층이다. 이들은 당연히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을 선호한다. 성인의 30-40%는 첨단 제품의 사용상의 어려움 때문에 테크노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때문에 신제품의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고령자 및 정신지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소비자에게 사용하기 쉽고 에러를 유발하지 않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잠재적인 큰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컴퓨터가 들어간 제품은 최소한의 비용만으로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조작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의 구현이 가능하다.
2. 마케팅 범위의 확대 : 기업의 주력 제품에 특별한 계층을 위한 기능을 포함시키는 것은 제품의 마케팅력을 향상 시킨다. 초기 휴대폰의 볼륨 조정 기능은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능이었으나 소음이 심한 곳에서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능이었고,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기능으로 소구되었다. 핸즈프리 옵션이나 이어폰 기능 또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일반인들에게도 상업적으로 성공함에 따라 휴대폰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3. 종합적 비용의 감소 : 장애를 고려한 디자인이 종합적으로 비용을 감소시키는 예를 찾아볼 수 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탈 수 있도록 외부에 시각, 청각적인 신호를 제공한 것이 결과적으로 엘리베이터 수를 줄여도 되는 비용의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
4. 고객 충성도 향상 : 소외계층을 고려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 소비자들에게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고객 충성도를 끌어 낼 수 있으며 버즈 마케팅(입소문 마케팅)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5. 숨은 비용의 감소 : 기업은 제품의 세팅과 사용과 관련해 고객서비스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는데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의 제공은 이런 비용을 현격히 감소시킬 수 있다.
6. 잠재적 기술 확산 :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개발 된 기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반인들에게 확산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첨단 인터페이스는 미래의 일반인을 위한 인터페이스의 방향을 제시해준다.
7. 시장 진입의 용이성 : 미국이나 유럽 등은 장애인을 위한 기능들을 법령으로 정해 결과적으로 시장 장벽을 만들고 있다. 미국 체신청은 시각장애인이 이용 할 수 있는 우표 자판기만을 구매하고 있는 등 정부로 조달되는 제품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무역 및 시장 장벽의 극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리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하고 있다. 고령자는 더 많은 기간을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일상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제품, 서비스, 주거환경, 공공 시설물 등 생활 속의 환경들이 고령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즉, 유니버설디자인이 일상 속에서 이뤄져야한다. 누구나 가족 구성원 중에 고령자가 있고 누구나 나이를 들면 고령자가 된다는 점에서 고령화 측면에서의 접근은 학생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더욱 체감적으로 와닿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접근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